<인터뷰> 손충렬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 (세계풍력협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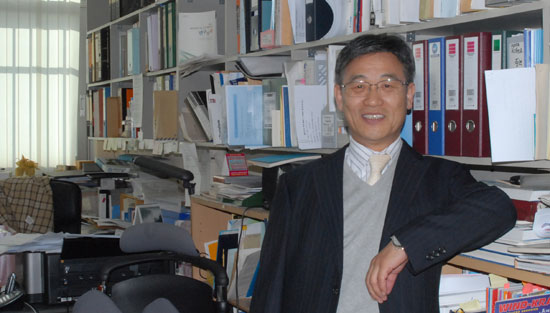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손충렬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65·사진>은 '호인(好人)'이다. 웬만한 부탁은 거절하지 않는다. 조건없이 도움을 줘 일이 잘 풀리면 함께 기뻐하고, 안되면 안쓰러워 한다. 남의 일도 이롭게 하려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DNA가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소탈하다. 교수, 박사, 학회장, 각종 위원 등의 직함에 따라붙는 권위나 위엄과 거리가 멀다. 머쓱한 상황이 오면 거리낌없이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린다. 모처럼 만난 이의 손을 부여잡고 반기는 모습은 영락없는 '이웃집 아저씨'다.
하지만 손 회장의 외양은 거기까지다. 그를 좀 더 알게 되면 온화함 속에 가려진 강직한 내면과 만나게 된다. 원칙과 명분을 중요시하고, 선의후리(先義後利)를 따진다. 불의와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투사기질도 있다. 그걸 모르는 이들에게만 '마냥 좋은 손 회장'일 뿐이다.
지난 10일 인하대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국내 풍력 1세대 전문가인 손 회장은 내년 8월 30일 정년을 채우고 강단을 떠난다. 그는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수학하고 현지 정책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본 몇 안되는 전문가다. 한국 풍력사(風力史)에선 여전히 큰 축이다.
손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풍력산업이 뜨고 있지만 긴 안목으로 접근하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없이는 RPS도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 RPS 도입을 앞두고 풍력이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다.

▶RPS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기회가 아니다. 일례로 새만금에 100MW 규모로 국산풍력 활성화 단지를 만들면 2MW급 50대가 소요된다.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지만 생색내는 수준이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효성, 유니슨, 한진산업, STX, 대우조선 등이 몇 대씩 설치하면 끝난다. 그 정도로는 산업부양이 안된다. 단지개발로 이어지는 투자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국산 해상풍력이 나갈 즈음엔 인·허가부터 사업화까지 법적정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
- 세계시장은 이미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독일, 덴마크를 필두로 미국,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후발주자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향후 가장 큰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다. 대단위 풍력단지에 국내 제품을 공급하려면 현지조립이 필수다. 외주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해외 선도업체가 발전기나 제작사 하나쯤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풍력 부품 조달은 선지급금 문제가 있어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풍력산업도 조선, 자동차 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어느날 갑자기 시작하니 적잖은 혼선이 있는 거다. 특히 풍력은 조선, IT, 자동차와 달라 현지사정을 무시하면 안된다. 내수시장 안에서 인정받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시장을 두드려야 한다. 또 저가정책으로 대단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스타스, 유지·보수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일 에너콘 등의 사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
- 국내 터빈 메이커(시스템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공유할 건 공유하고, 오픈할 건 오픈하자. 우리나라는 그게 안된다. 또 연구개발 자금의 3분의 2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면 아무리 자기 투자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 비용을 제품가에 반영하면 안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 대기업의 경우 소위 월급쟁이 사장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풍력은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이 우리 풍력산업이 처한 딜레마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R&D사례는 교훈이 된다. 미쓰비시도 처음엔 100kW급 상용화에 실패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지원 없는 독자적 연구개발을 선언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풍력에 투자했다. 게다가 단지개발, 금융부문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미국으로부터 1000기를 주문받았다.
- 풍력발전 1세대로 국내 산업 발전사를 지켜봤다, 소회는.
▶지금까지 두 번 풍력을 떠나려 했다(웃음). 한 번은 말도 안되는 R&D를 그냥 지켜봐야 했을 때고, 또 한번은 해외 전문가를 국내로 불러들여 1500명 가량을 교육시키고 사비로 부족한 돈을 메웠을 때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심사해야 했던 현실도 견디기 어려웠다. 다행히 현 정부들어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풍력산업이 확대되고 인략양성센터까지 들어서는 걸 보니 '풍력인'으로 뿌듯하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건 긴 안목으로 접근하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술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독일은 과거 철강산업 인력이 신재생산업으로 이동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과연 우리나라에선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업은 고용창출을 이어 줄 인프라가 필요하다. 국내 산업도 RPS에 목매선 안된다. 중요한 건 사업 다음의 일자리, 국부창출이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화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변해야하나.
▶빗대보면 이렇다. 영국 BP는 초기 해상풍력 시절부터 폐쇄 이후의 발전단지 활용을 검토했다. 일본 쇼와쉘 석유는 태양광에 1000억엔(약 1조3042억원) 투자한다. 미리 내다본 것이다. 우리나라도 오일수입을 위해 쓰는 예산의 10%만 신재생으로 돌려라. 그러면 충분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더라도 그게 주력 에너지원이 되면 곤란하다. 후세들이 폐기물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2050년 해상풍력이 전력공급의 50%를 공급할 즈음이면 풍력이 원자력 이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왜 우리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나. 신재생산업의 경쟁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좌우된다. 신재생을 경제성으로 따지면 안된다. 경제성 운운하는 사람에겐 태양광이나 풍력을 집중 육성하는 일본이나 독일이 바보냐고 묻고 싶다. 그들이 왜 세계 1위인지 행정·정치인도 공부해야 한다.
- 향후 활동계획을 말해달라.
▶국내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뻗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또한 향후 유망시장이자 경쟁자인 중국과 동반자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 우리 기업의 국제 기술개발 참여도 활성화하고 싶다. 퇴임 후에도 풍력학회장과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부회장으로 열심히 뛸 것이다.
|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
